메모지에 내가 좋아하는 향기펜으로 詩를 써 보았다.
그 서걱거림이 좋았지만, 왠지 낯설어 서글프다. 어..... 이게 아닌데.
요즘 글씨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 아닌 고민을 했다.
학창시절 땐 나름 글씨 좀 쓴다고 칭찬도 들었는데, 자주 쓰지 않아서 그런가보다.
말씀 묵상할 때 잠깐 긁적이거나 기도 제목을 쓸 뿐이다.
펜(연필)보다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자판이 익숙하다.
한번쯤은 삐뚤빼뚤 글씨로 내 글씨체가 안녕한지 확인하고 싶을 때 있다.
시를 읽고 싶을 때, 딱 이맘때~~ 가을이 익어갈 즈음에...
마음에 드는 메모지나 수첩 모으기 의외로 좋아한다.
모아서 언제 사용할까 싶더니 詩 필사할 때 유용하게 쓰일줄이야^^
저절로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마법의 詩들을 만난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끝까지 남겨두는 그 마음」이다.

'멀리서 빈다' 이 시를 많이 좋아한다. 특히, ~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톡으로 오랫만에 안부를 물을 때 이 시를 적어 보낸다.
가을이 깊숙이 들어오고 찬 바람이 부는 날에 마음도 왠지 허하고 서늘해진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가까이 있지 않아도 은근하게 통하는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인사를 남기고 싶다. 나도 따뜻해진다.

시인의 곁눈질이 살짝 귀여웠다.
사람으로 인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솟고, 따뜻해지고, 즐거워진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신경쓰였던거다.^^ 나는 자주 하나님을 외롭게 만드는데.....
하기사 봄의 상사는 그 누구라도 못 말린다.
가을의 상사는 병이 된다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
나는 가을의 하늘과 바람, 풀잎, 별과 달, 볕과 그 공기가 너무 좋은데
이건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네.

생각대로 다 말하는게 솔직하고 좋은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침 한 번 삼키면서 한 템포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말도 거름종이가 필요하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더욱 말의 조심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많은 말보다 보아주고, 생각해주고, 참아주는게 마음의 텃밭을 얼마나 풍족하고 윤택하게 하는지
그리고 마음의 깊이와 넓이는 잠잠히 배워갈수록 점점 어렵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아간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그러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 품는게 사랑이다.
혹여나 나도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족한 사람이기에 품어주면 차암 고맙겠다^^

괜시리 마음에 찬 바람 들어오듯 허한 날이 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까아만 밤에 더 까만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었다.
시골의 깊은 밤이었다면 인적 드문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헤아렸겠지.
유달스레 반짝이는 별을 찾는다. 예쁘다^^ 괜찮다. 이제~~~
내일은 내 눈에 띄지 않기를, 내 마음에 훈풍이 불기를 바라면서.
그리움 하나, 쓸쓸함 하나, 허허로운 날 하나.... 모든 감사한 날로 퉁 쳤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 말들을 시인의 詩에서 많이 보았다.
이 오골거리는 단어들이 일상의 언어가 되기까지 시인은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을까?
차마 입으로 표현하지 못한 말들은 그리움으로.
어떤 날에 사람이 그립고 보고 싶은 것은 어떤 날의 기억이 좋았기 때문이고,
어떤 날에 마음이 힘겹고 답답한 것은 어떤 날의 기억이 아팠기 때문이다.
어떤 날이 생각나지 않음은 소소하지만 무탈한 날들이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은 평범한 날들을 보내지만 매일 감사하다.
보이는대로 예쁘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곱다, 뭉클하다, 고맙다, 멋지다......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들이 많아져서^^

옷을 정말 안 사는데, 아비토끼랑 위 아래 검은색 옷과 구두 한 켤레씩 샀다.
지금 당장 입을 옷은 아니지만 상갓집 갈 일이 생기면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이상했다. 우리는 아직이라 말 하고 싶은데,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더욱.
이 옷은 아끼고 싶었다. 금방 꺼내 입고 싶지 않은 옷이다. 아니 어쩌면 영영.....
시간이 흐르니 먹고 싶은 좋은 음식도 그다지 생각나지 않는다.
그냥 한 끼 감사하게 먹을 뿐이다.
어릴 땐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도 많았는데...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좋아하는 사람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했다는 것, 내 일기장에 흔적처럼 있네.
사랑스런 아이, 효진이가 그랬으면 좋겠다.
좋은 옷 있으면 입고, 먹고 싶은 음식 맛있게 먹고, 좋은 음악 많이 듣고, 좋은 사람?
글쎄 지금은 아닌데..... (엄마 마음에) 그냥 그리워하기만^^


365일 날마다 선물을 받는다. 그것도 날마다 새 날, 언제나 지금으로^^
이렇게 무탈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이다. 더 바랄 것 없다는 시인의 고백이 좋다.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 지금 46Km로 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멈칫하면서 구경할 수 있다. 눈에 담고 마음에 넣는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차곡차곡 모으고 싶다.
- 산책 -
여보, 여보, 여보
또 봄이야
여름이 왔나 싶더니
이제는 또 가을이야
여보, 여보, 여보
이걸 어쩜 좋아?
가을 바람 심상찮고 겨울이 들어올려고 한다.
달콤새콤 밀감 까 먹을 시간, 기다려진다.
詩는 역시 울긋불긋 온통 물들어갈 때 읽어야 느낌 있다.
그냥 푹~ 안기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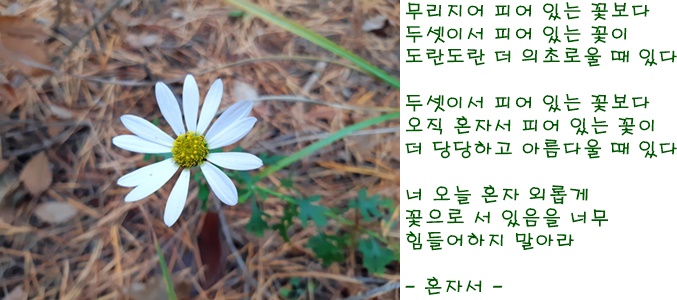
'마음 한 뼘 책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동일의 De ratione studii (공부법에 관하여) (0) | 2020.10.27 |
|---|---|
| 시편 하루 묵상,「고단한 삶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 (0) | 2020.10.22 |
|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태도 수업」 (0) | 2020.10.16 |
| 「정말 제가 사랑스럽나요?」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0) | 2020.10.14 |
| 한국형 플랫폼 노동의 현실,「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0) | 2020.10.12 |

